
풀무학교 생태농업전공부
칼럼·독자위원
흰 여백. 까만 선이 그어진다. 약속한 모양대로 선들이 모이면 글자. 글자가 모여 단어와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글이 된다. 그리고 글이 모여 하나의 책으로 묶인다.
어찌보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글이 없고 책이 없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니까. 책 같은 게 없던, 문자조차 없던 시대에도 다들 그런대로 잘 살지 않았겠나. 급하다면 먹을 게 제일 급했겠지.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 누군가 이렇게 핀잔을 준다면, 그러는 너는 낫 놓고 낫질이나 해본 적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요즘은 책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몸으로 배우고 아는 게 나에게는 우선으로 여겨진다.
하물며 수집이라는 취미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사실 조금은 경멸하는 마음도 있다. 쓰임새도 없는 거 뭐하러 그렇게 모아두고 심지어 장식이나 진열까지 해놓는 건지. 언젠가 TV에서 야구선수용 글러브와 배트 등을 유리로 된 장식장에 예쁘게 진열해 둔 사람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찼던 기억이 있다. 돈도 돈이지만, 그라운드에서 공을 때리고 잡는 용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깨끗하게 관리된다고는 하지만 제 자리가 아닌 곳에 처박혀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책은 좀 낫다. 마음만 동하면 언제든 꺼내 읽을 수 있기도 하고,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깊이 받아들였을 때 변화하는 자신을 느껴본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책의 쓰임새라고 하면, 응당 세심히 읽고 책의 메시지를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책장에 읽지 않은 책이 수두룩하게 꽂혀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겸연쩍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내 게으름을 탓하면 탓하지 수집 자체를 목적으로 책을 사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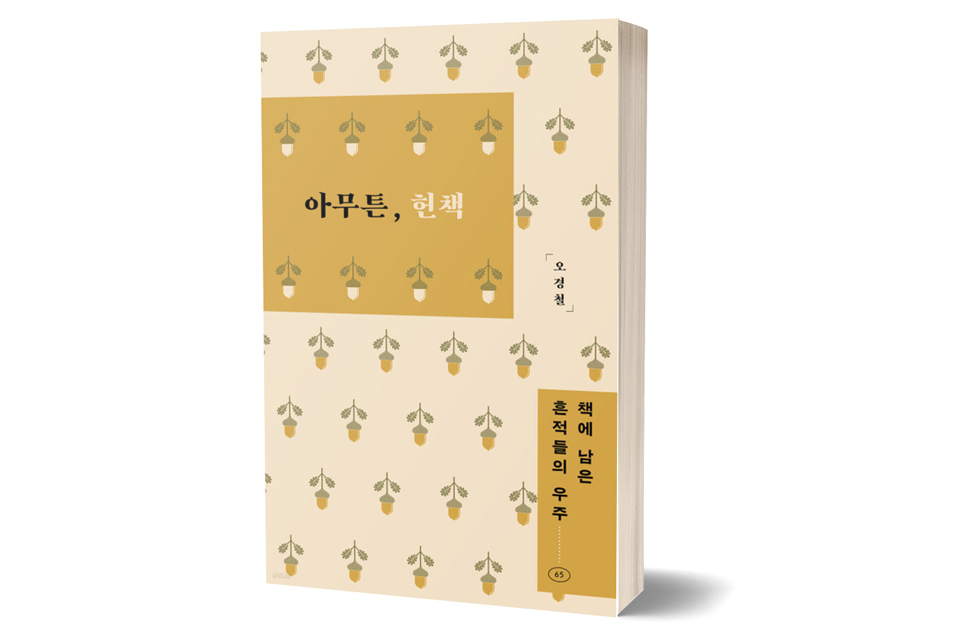
《아무튼, 헌책》의 저자 오경철은 그 자신이 책을 만드는 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독한 헌책 수집 마니아다. 그놈의 수집이 대체 뭐라고 읽지도 않을 책을 서가에 진열해놓고 뿌듯해하는지. 심지어 일일이 소독하고 깨끗이 닦고, 오래돼 바스라진 책등을 고이 모아 비닐봉지에 넣어두기도 한다. 그러면서 수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을 많이도 인용해놓았는데, 대강 이렇다. 자기 마음을 유달리 사로잡는 혈연관계의 형제들을 만나는 것과도 같으니 ‘왜’나 ‘쓸모’와 같은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지 말라. 책은 서가에 꽂혀있는 것만으로 제 역할을 다 한단다. 귀한 손님이 올 때에야 꺼내 사용하는 자기 그릇을 매일같이 쓰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에 견주어 생각해 보면 아주 이해 못 할 일은 아니기도 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는 좀 더 깊이, 좀 더 가까이 엮이고 싶기 마련이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이 두 가지가 긴밀히 연결돼 있기도 하다. 특히 본인이 가닿고 싶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여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세계라면 더욱 그렇다.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본인이 직접 그 무대에서 뛸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선수의 유니폼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꽤나 자연스런 일이다. 그것을 입고 직접 축구를 하는 것은 좋아하는 대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충만감을 안겨줄 수 있다. 만약 그 유니폼이 월드컵 결승과 같이 중요한 무대에서 실착한 것이라면 어떨까. 세탁을 통해 그 당시 흘린 땀이나 묻은 잔디와 같은 것들은 지워졌겠지만, 그리고 따지고 보면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유니폼과 물질적인 구성에서 아무 차이도 없겠지만,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물건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세계에 있고 싶은 마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내가 그 세계에서 살진 못하지만 그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된 물성을 가진 것들을 제 주변에 둠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책은 중요하다. 좋은 책을 가까이 둠으로써 그 세계에 좀 더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 역시 소중하다. 그러나 결국엔 삶이 먼저다. 책은 그냥 책일 뿐이다. 글자 너머에서 배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종이쓰레기에 불과하다.
시골집 아궁이에서 불쏘시개로 쓰일 뻔했다가 한 거간꾼에 의해 구제됐다는 겸재 정선의 그림첩에 얽힌 에피소드를 읽으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불쏘시개로 쓰여 밥 짓는 불이 되거나 아랫목을 뜨뜻하게 데울 수도 있는 거지.
목숨보다, 생활보다 앞서는 예술은 없다. 서문을 열고 책의 안으로 들어가 한 획, 한 획이 안내
하는 글의 길을 따라 걷고 충분히 살기도 하다가, 마지막 장을 닫으면 결국 책 밖으로 다시 나와야 한다. 인생 자체를 아름답게 사는 것.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오늘도 책을 곁에 두는 모순 속에 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