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녹색당
칼럼·독자위원
농번기 시작부터 마을엔 다시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일손 부족을 ‘해결’하러 온 계절노동자들이다. 볍씨파종 하던 날, 손을 맞추던 옆 사람이 말했다. “언젠간 이 일도 외국인들한테 ‘넘어가게’ 될걸.” 기시감이 들었다.
1990년대 초, 농촌을 떠난 우리 가족이 터를 잡은 곳은 안산, 반월 공단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였다. 주민은 우리처럼 고향을 떠나온 이들이 대부분이라 이웃들과는 가족처럼 의지하며 지냈다. 언니들을 시골집에 남겨 두고 어린 나만 간신히 데려온 상경에 부모는 애가 탔겠지만, 끈끈하고 다정했던 시간으로 그 마을, 그 시기를 회상하게 된다.
떠올릴 때마다 미화가 되는지 나이 들수록 전보다 아름답게 그려지는 유년 시절은 동네에 외국인이 ‘밀려들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끝이 났다. 부모들의 공장 동료이자 가까운 이웃들이 마을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마는 더는 일을 다니지 않고 집을 한 채 사서 세를 주기 시작했는데, 주요 세입자는 외국인들이었다. 방이 빠질 때마다 우리 자매들은 다음 세입자를 맞이할 청소를 했다. 벽지가 심하게 찌들어 교체해야 할 때는 서툰 솜씨로 도배도 했다. 허구한 날 붙들려 청소하게 만드는, 떠날 때면 쓰레기를 가득 쌓아두고 떠나는 ‘그들’이 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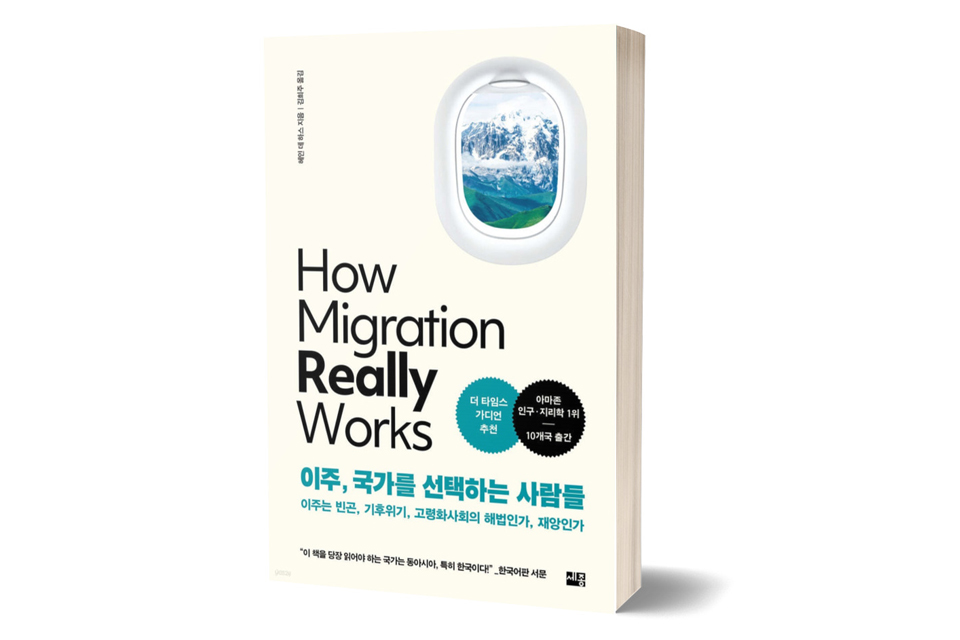
사회학자 하인 데 하스의 《이주, 국가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주와 이입민에 관한 오해 22가지를 파헤친다. 그중 가장 낡았고 끈질긴 오해가 “이입민이 일자리를 훔치고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이야기다. ‘그들’이 ‘우리’를 밀어낸다는 이미지는 너무 강력해서 진상을 알고 나서도 집요하게 마음에 남는다.
당연하게도 이입은 실업의 원인이 아니라, 실업에 의한 반응이다. 동네 이웃들이 떠난 이유는 ‘그들’이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위기가 터지고 공장 임금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이런 전후 관계는 정치인, 언론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된다.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은 경제 자유화 확대, 노동 시장 규제 완화의 결과지만, 문제의 원인을 의도적으로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 그중 하나가 ‘(불법)이주민’이다. 저자의 표현처럼 “정치인들은 이입에 반대한다는 수사를 구사하며 이입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암시해 토박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이간하려 든다.”
인력 없는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계절노동자 도입이 본격화됐다. 공단 선주민이 떠날 때, 정치계와 일부 언론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는 대신 가장 약한 자에게 화살을 돌려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동의 이익을 찾지 못하도록 갈등을 조장해 왔다. 비슷한 과정이 농촌에서 반복될까 우려된다.
“외국인 남자 12만 원, 여자 10만 원 이상의 임금 지불시 고발 조치” 두 해 전 마을 도로에 붙었던 현수막 문구다. 이주민 1.5세대인 친구는 일손 부족을 도우러 온 사람들에 대한 선주민의 태도에 경악했다. 저 문장만 두고 보면 농장주는 임금 담합을 노골적으로 시도하는 이기적인 경영자로 비친다. 동시에 ‘하루’의 의미가 남다른 농번기에 ‘임금 경쟁’을 부추겨 일손을 빼갈 때 느껴질 농장주의 다급함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대도 이런 해결 방식은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선주민 경영자 대對 이주민 노동자’ 구도로 문제를 환원할 위험은 무엇이든 피하는 게 낫다. ‘농촌 위기’라는 현실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결정들을 내려온 책임 소재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계절노동자 도입을 앞두고 농업 규모화에 비판해 온 농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철원군농민회장은 정책 도입 전 한국농정신문 인터뷰에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농가, 즉 자본력 있는 대규모 농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이라 지적하며 “(계절노동자 도입이 아닌) 가족농, 소농이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규모화에 치중한 정책은 물론 각종 혐오 시설이 밀집한 농촌, 천시되는 농업, 서울 중심주의, 시장 자유화 등 전반을 조망하지 않은 채 타국에서의 일손 구하기는 농촌 위기의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그 ‘일손’은 노동력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계절’ 노동자니까 한 철 살다 가면 끝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모든 이주는 어느 정도 영구 정착을 수반한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정체성과 의지를 포용할 준비는 된 것일까. 우리의 초대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울화’의 타깃이 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