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조개를 주우면 여기에 담으세요.”
그녀는 작은 비닐봉지를 하나 주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은 했으나 조개를 주우려는 목적으로 해변에 온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런 식의 친절은 곤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요 앞에 있는 결핵요양소에 있어요. 어느덧 몇 년 동안이나 서울에 가 보지를 못해 서울에서 오신 분을 보면 반가워지는군요,”
여자는 품위 있는 미소를 띠우며 말했다.
“네에, 그러세요?”
연숙의 대답은 어정쩡했다.
“슬슬 가 볼까?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하고……”
“차? 자동차가 어떻게 됐나요?”
“모래땅에 빠져서 바퀴가 헛돌고 있어요.”
“어디서?”
“바로 저기예요.”
소영은 적당히 대합했지만 연숙은 그 말과 동시에 차의 위치를 정확히 대답을 하고 말았다.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콜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의 집 앞에서요.“
소영은 순간 연숙의 발을 걷어찼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아, 그럼 강규진씨 집이군요. 함께 갑시다. 규진씨가 차를 빼내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파이프의 사나이는 결핵환자 부인이 울타리 너머에서 이름을 부르자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왔다.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운 느낌이 온 몸에서 풍겨 오는 것 같았다.
“왜 그러시죠?”
사나이의 음성은 몸이 저려올 정도로 깊고 맑은 음성이었다. 부인은 간단하게 소영이 일행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했다. 깡마른 여자는 사실보다 과장해서 강규진이라는 남자와 만나게 된 기회를 얻어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나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 콜리가 조용히 그를 뒤따랐다.
자동차를 보자 그는 당혹한 것처럼,
“전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하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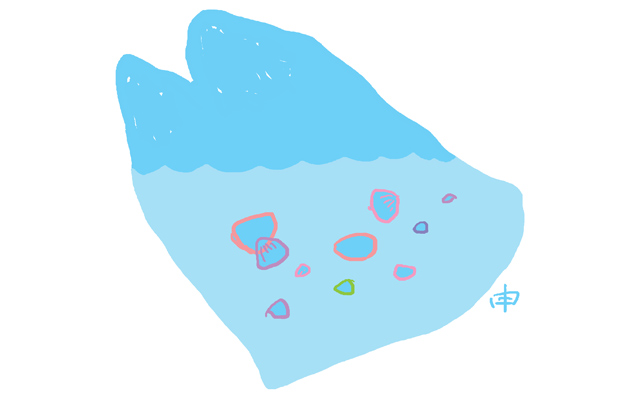
“어디 수리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부인은 엉뚱하게도 애교를 떨며 말했다.
“실은 제 친구들이 B호텔에 있습니다. 어젯밤 잠을 자지 못해 쉬고 싶다고 하면서 점심때까지 쉬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에게 전화로 물어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아가씨들, 그 때까지 여기서 놀며 기다리시지.”
“그렇게 하죠.”
그 사나이는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었지만 친절하게 안내했다. 흥미 있는 상대와 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연숙과 소영 그리고 깡마른 여자, 세 사람이 정원으로 들어가자 그는,
“여기 앉으시죠, 부인.”
하면서 자기가 앉아 있던 의자에 강마른 부인을 앉히고 그녀들에게는 도자기로 만든 의자에 앉게 했다.
덥지도 춥지도 않았으므로 밖에 앉아 있는 것이 퍽 쾌적한 기분을 주었다. 규진은 묵묵히 방갈로로 들어가더니, 낡은 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장미빛의 화려한 모포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모포를 아무 말없이 부인의 무릎 위에 덮어 주었다. 그 아무렇지도 않는 듯한 행동은, 소영과 연숙에게는 그 사나이와 그보다도 나이가 네다섯살은 더 많아 보이는 부인 사이에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이 분은 화가예요. 이분의 이름, 들어본 적 없어요?”
모포 속에 깊숙이 파묻힌 부인이 말했지만 소영과 연숙은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 사나이는 계면쩍은 정도의 표정은 짓지 않았지만 그런 화제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모양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전 그림을 좋아하지만 아직 원하는 그림을 살 정도는 못 되어서 화가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계속>
<이 연재소설과 삽화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