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게 말하는 소영도 스스로 과연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이었던 것이다. 아니, 아직은 젊음이라는 고독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여자들에게는 극도로 발달한 문명처럼 자동안전장치가 몸 구석구석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쪽 엔진이 멎으면 비상 엔진을 걸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좌석 채 비행기 밖으로 탈출시키는 장치가 되어 있는 제트비행기처럼, 아무리 열렬한 사랑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남자의 무리한 약점을 언제나 무의식 적으로 계산을 해가면서, 여자는 비상시의 태세를 갖추고 현대라는 괴물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영이 여드름 녀석과 ‘검은 목걸이’로 지방 공연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2주일 후의 이었다.
남자의 매력, 여자의 매력
그 해 가을.
소영과 연숙이는 우연히 거리에서 알게 된 청년들과 시외로 드라이브를 갔었다. 골빈당 이라고 해야 할 이 청년들은 포카를 하거나 화투놀음을 할 때 판돈도 크거니와 끝장을 볼 때가지 밤새우는 짓거리를 예사로 했다.
드라이브를 가던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그 날 아침 7시에 소영의 집에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지금 막 포카가 끝났어, 잠을 자러 바닷가에 있는 B호텔에 가야겠는데 함께 가지 않겠어?”
하고 잔뜩 졸린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소영은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이기도 하고 일요일을 집안에 처박혀 지내는 것 보다는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가는 편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라고 생각해서 별 싫다는 소리 없이 승낙을 했다. 소영은 혼자 그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따분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아 캠퍼스 기숙사에 있는 연숙이를 불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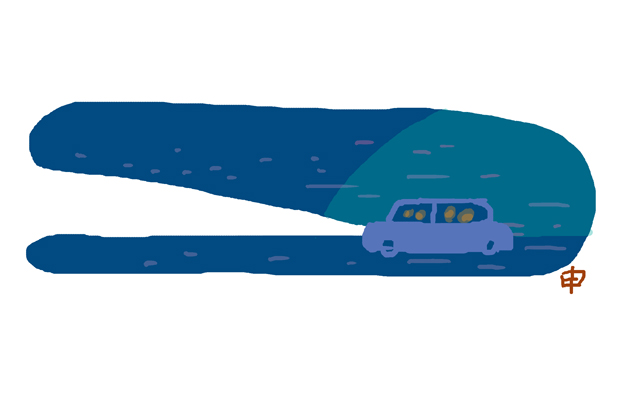
“얘, 너 그 화끈한 사교성은 좋지만 또 일 저지를라……”
연숙이는 소영의 특이한 유혹을 받고 슬며시 빈정댔다. 연숙은 웬만한 일에는 소영의 말을 거절하는 일이 그다지 없었다.
한 시간 후에 이미 소영과 연숙은 게슴치레 잔뜩 졸린 얼굴을 한 청년 두 녀석과 낡은 차를 타고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아아…… 졸려!”
운전을 하고 있던 청년이 입을 쩍 벌리며 하품을 했다.
“머리가 띵 하구나! 멍청이가 된 기분이야.”
다른 한 명이 맞장구를 쳤다.
“한심해, 한심하지! 머저리가 안 되고 배겨날 것 같아? 밤새도록 짓거리를 했으니……”
연숙이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소영의 손이 그녀의 옆구리를 꼬집는 바람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정력들이 대단하셔!”
소영이가 슬쩍 화제의 방향을 바꾸면서 말했다.
“밤을 새워 쓰러질 정도로 피곤한데도 여자들과 또 놀겠다고 하는 그 투지가 훌륭해!”
소영의 비꼬는 투의 소리였지만 두 녀석은 머저리인지 정말 멍텅구리인지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의 국도는 상쾌한 가을빛으로 물들어져 있었다. 이 몽롱한 정신을 한 두 남자의 눈에 길 양 쪽의 아름다운 경치가 어떻게 비쳐지고 있을까. 아니 그것보다는 차를 운전하는데 자칫 졸다가는 이 세상 끝나는 날이므로 무슨 말을 지껄이게 해서라도 졸음을 쫓아 주어야 했다.
그래서 소영과 연숙은 노래를 부르며, 지껄이며 드라이브를 했다. 춘천시외의 근처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짓푸른 바다는 가을빛과 더불어 맑은 물빛을 띄고 있었다. 자동차가 찾아 들어간 곳은 태양빛을 받아 눈부신 바다를 정면에 둔 호텔이었다. 로비로 들어서자 말하는 앵무새가 입구에서 ‘안녕 하십니까’ 하고 소영의 일행에게 인사를 했다. 소영은 한 쪽 눈으로 윙크를 찡끗해 보이며 ‘응 너도 안녕해?’ 하고 말대꾸를 해 주었다. 그들은 소리 내어 웃어댔다.
방으로 안내되어 들어서자 두 남자는 기진맥진한 사람처럼 침대 위에 쓰러졌다.
<계속>
<이 연재소설과 삽화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