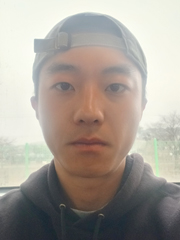
풀무학교 생태농업전공부
칼럼·독자위원
‘태연히 절망하는 태도.’ 세상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권력에 근 시일 내 우리가 이를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자연 파괴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내가 선택한 적 없는 기술과 상품에 둘러싸여 적당히 괴로워하고 적당히 소비하다, 무엇 하나 끝까지 밀고 가지도 못하고 한번 대차게 싸워보지도 못한 채 애매하고 찝찝하게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이렇게 태연하게 말해버린다.
냉소주의자의 유일한 자부심이라면, 나는 내가 세상의 나쁨에 어느 정도로 연루돼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 위선은 떨지 않는다. 그러나 냉소주의자는 체제가 무의미하거나 더 나빠졌다고 비난하면서도 그 체제에서 계속 일할 수 있고, 그 체제를 바꾸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지구 전체의 물질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태어나고 싶진 않았다는 것. 이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자유와 민주주의만큼 그 의미가 오염된 단어는 없을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라고 두 단어를 붙이면 더욱 그렇다. ‘공산주의’가 아닌, 대의제와 중앙집권 정부를 전제로 하는, ‘시장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는 믿음이 있는, 그런 근대국가가 연상된다.
그러나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다수 민중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본래 뜻에 얼마나 가까운 세계인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차원의 자유가 현재 존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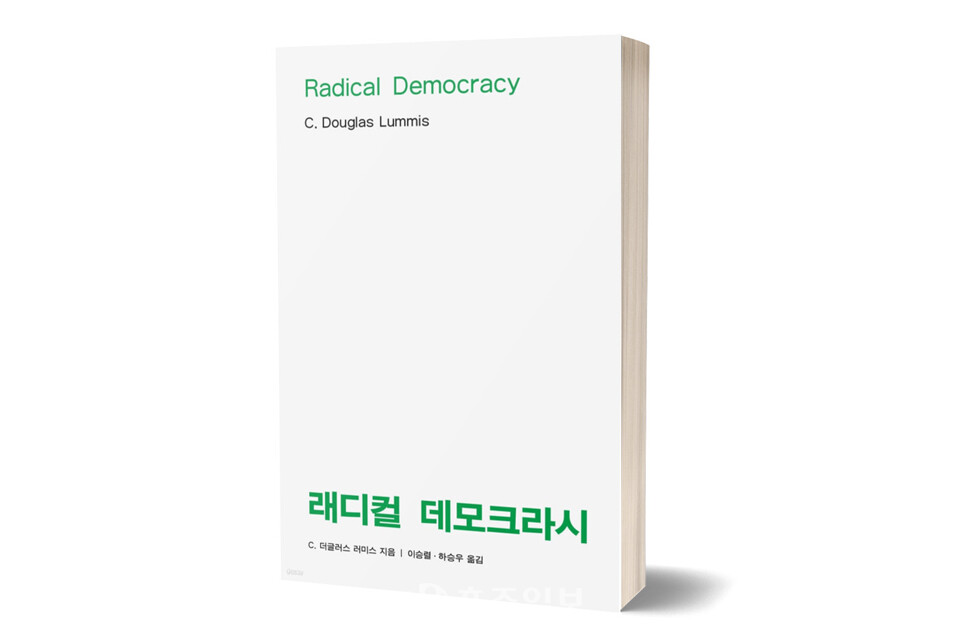
더글러스 러미스에 따르면 민주주의란 ‘어떤 상태’이다.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직선제나 대의제가 갖춰져 있다고 해서, 시장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 상태가 보장되진 않는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민주적인 선거의 반민주적인 잠재력.’ 이 말은 최근 10년 새 두 대통령을 탄핵했던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다양하고 날카롭고 급진적이었던 광장의 언어들은 모두 어디로 휘발됐는가. 저항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며 사회가 전환하는 시점마다 치러졌던 선거는, 폭발하던 민심을 대변하기는커녕 민심을 다스리고 잠재우는 역할을 맡았다. 광장의 시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민중들에겐 ‘누가 더 싫은지의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시골에 산업단지가, 새 공항이, 발전소와 송전탑이, 폐기물 처리장이, 고속도로가, 선거철만 되면 내놓는 각종 개발전략이 대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라도 했는가? 왜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가?
답은 명확하다. 지금의 제도가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래디컬(radical)은 ‘급진적’, ‘근본적’이라는 말로 번역되곤 한다. 전자는 도약을 후자는 맨 밑바탕을 의미한다. 언뜻 상반되어 보이는 두 의미가 한 단어에 묶일 수 있는 이유는, 래디컬의 어원인 뿌리(root)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뿌리는 땅 밑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없으면 그 위의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뿌리에서부터 의문을 갖는 것은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뒤엎는 것이기에 ‘근본적’인 동시에 ‘급진적’이다. 러미스가 민주주의 앞에 굳이 래디컬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현존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근원적 상태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함에도, 그렇게 착각하고 착각 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원에서부터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우린 이미 진 상태에서 살고 있다. 권력이 집중된 정부에, 강제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임금노동이 없으면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는 산업사회에, 대규모 기계에, 모든 자연과 인류를 자원으로 포섭하려는 초국적 기업에, 서구 문명이 제3세계에 강요한 ‘개발’에 져버렸다. 이런 세계에서는 냉소를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덜 스트레스 받는 길일지도 모른다.
홉스의 자연상태에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만연하여 중재자로서 권력을 독점한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 나는 믿을 수 있지만 타인은 믿을 수 없는 불행한 세계. 인간의 내면에 이런 세계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대야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지 모른다.
신뢰란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얼굴을 가린 두 사람이 총과 책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을 때, 선택권이 나에게 먼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고르는 것. 그런 신뢰가 대체 어디서 오느냐고 묻는다면, 하잘것없는 일상과 일터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얼굴들과의 자잘하고 싱거운 약속들에서 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사랑한단 사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좀 손해보는 것 아니겠냐고, 그게 실은 손해가 아닐 거라고, 궁색한 대답을 늘어놓을 수밖에.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