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로부터 일년쯤 지났을 무렵, 소영은 갓난 애기를 품에 안은 젊은 남자가 뜰에 피어 있는 나팔꽃을 어린 아기에게 보여주고 있는 광경을 울타리 사이로 보았다.
“여보세요!”
소영이가 불렀다.
“언젠가 제주도해안에서 함께 지낸 적이 있죠?”
젊은 남자는 놀란 토끼처럼 소영을 바라보았다. 당황해 하며 동요하는 눈빛이 한 순간 지나가더니 그는 이내 마치 처음 대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듯 말했다.
“아, 이웃 이었군요 그 때에는 실례 많았었습니다.“
“어떠세요? 이젠 완전히 어른이 된 것 같군요.”
“아, 요새는 주로 애만 보고 있습니다.”
젊디젊은 아버지라 해야 할 그는 남자로서 무능함이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였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난 결혼이 너무 일렀어요.!” 하며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양이었으며 성민의 어머니는 괴로운 나머지 소영의 어머니에게 푸념을 늘어놓더라고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했었다.
이제 나팔꽃이 핀 그 앞에서 행복한 얼굴로 자기를 안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소영은 그의 비범한 태도를 어쩐지 이해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앙케이트를 내놓으면서까지 사랑하던 술집 여자와 헤어진 것도 중매로 알게 된 아가씨와 결혼하게 된 것도, 조성민 그에게 있어서는 모두 자신에게 충실하고자 한 일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었다.
그는 경수처럼 체력에 자신이 없었으므로 투쟁 한다던가 곤경을 헤쳐 나가며 생활해 나가는 힘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지도 않았다.
그는 단순히 주어진 환경의 범위 내에서 생활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남자였다. 어딘가 약아빠진 듯 하고 머저리 같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믿을 수가 없지만 그는 한 편으로 적으나마 선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소영은 이웃집 성민을 볼 때마다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동시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연민의 정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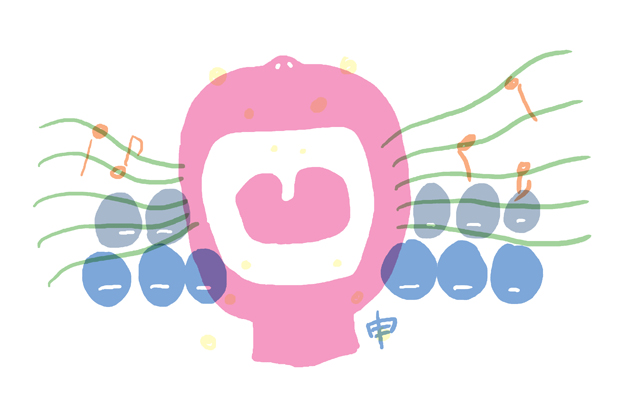
마지막 보이헌팅
소영의 형부, 유명세 교수의 S대학교에서 어느 날 묘하고도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캠퍼스의 축제 일정 중에 체육대회가 있던 날이었다.
총장의 훈시가 있고 학생처장의 격려사가 끝난 뒤, 사회자가 ‘애국가 제창’의 순서를 알렸다. 마침 피아노도 브라스밴드도 없는 야외였으므로 음정이 잘 잡히지 않아서인지 학생들은 애국가 부르기를 시작하지 않았다. 사회자는 응원단의 한 학생에게, “먼저 선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했다.
핑크색 셔츠와 몸에 꽉 달라붙은 블루진 바지를 입고 있는 그는 대열의 앞으로 나와 첫 구절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선창을 했는데도 학생들은 따라 부르지 않았고 거의 반쯤 가사를 불러 나갔음에도 뒤따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총장과 교수는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선창을 한 학생 또한 별난 학생이었다. 누구하나 따라 부르지 않는데도 그는 눈썹 하나 끄떡도 하지 않고 마지막 구절까지 독창을 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세상이 넓고 또 어떠하다고 하지만 모인 사람들이 애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는데도 홀로 대표나 되는 듯이 솔로로 부른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었다.
학생처장은 화가 치밀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애국가는 모두 다 함께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처장의 음성은 억양이 올라가 있었다.
싱글거리고 있는 학생, 하품을 해 대는 학생,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은 어찌된 영문인가.
“다시 불러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엄숙하고도 힘차게 부릅시다!”
<계속>
<이 연재소설과 삽화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